지난 연재글인 고려 축성기술의 퇴보는 왜 발생했는가? 에서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에 비해 고려의 성곽 축성기술이 어떻게 퇴보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리고 그 원인이 한대 지역유력자로서 축성에 관리자로 참여했던 장인(匠人)집단의 지위 하락과 강제동원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바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두드러졌던 사농공상(士農工商), 아니 그보다는 공상천례(工商賤隷)라고 불리는 장인집단에 대한 천시와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동원체계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때 고려후기 상공업의 발달과정에서 관영건축에 장인(匠人)에 대해 급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나타나지만, 조선이 건국되면서 장인집단에 대한 강제동원 체계는 조선의 건국세력인 신진사대부층에 의해 다시 복구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의 축성기술은 어떻게 변화하였을까요?
그런 조선의 축성기술의 변화를 살펴보려면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왜 하필 조선의 읍성에 주목해야 할까?
조선의 성곽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대부분 정조대의 수원 화성이나, 남한산성 같이 잘 알려진 성곽에 주목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의 축성기술이 날것으로 잘 드러나며, 조선과 그 이전의 한반도 국가들을 구분해주는 성곽이라면 무엇보다도 읍성(邑城)일 것입니다.

-----복원된 경상도 창원의 웅천읍성----
조선시대에 사용된 산성의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경우가 삼국시대부터 이어져온 것을 개축하여 사용한 경우가 많고, 지형을 활용하기에 축성기술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조선의 읍성들은 조선 전기에 대거 신축되었으며, 대체로 평지에 건설되어 축성기술이 날 것으로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말선초의 전환기에 왜구의 대규모 침략은 서해, 남해, 동해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연해지역과 내륙까지 이르렀고, 이는 조선 전기에 대규모 읍성 건축으로 이어집니다. 조선의 축성기술의 일반적인 기준을 둔다면 읍성에 주목하는게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조선의 읍성을 축성기술의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면 자주 나오는 반론이 있습니다.
읍성은 행정적 목적으로 지어지고, 산성은 방어적 목적이다. 읍성으로는 조선 성곽을 평가할 수 없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읍성은 내부에 지방관이 통치를 하는 치소(治所)가 위치하기 때문에 행정적 목적을 가진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행정적 목적만 가진다면 성벽을 설치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김헌규의 "조선시대의 지방도시 읍치의 성립과 계획원리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1454년의 세종실록 지리지를 기준으로 할 때 전국의 군현 중 읍성이 설치된 경우는 33%에 불과합니다. 1530년의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준으로는 35%에 불과하지요.
군현의 70%는 치소에 성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행정목적으로 성벽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실제 읍성이 건축된 위치를 살펴보면 왜 읍성을 건축했는지에 대한 의도가 잘 드러납니다.

---라경준의 "조선후기 성곽 축조 기법의 변화" 참조----
세종실록 지리지를 기준으로 읍성의 배치와 당시의 주요 도로망을 살펴보면, 읍성들은 외세의 침략이 발생할 경우 노출되기 쉬운 연해 지역과 도로망의 주요 목 지점에 건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읍성은 해당 지역의 백성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고, 수도로 향하는 침입경로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읍성이 행정 목적이라는 것은 오해란 이야기죠.
근데 읍성이 군사목적이라면 왜 조선은 삼국시대의 조상들과 달리 방어에 불리하게 평지에 지은걸까요?

-----김헌규의 "조선시대의 지방도시 읍치의 성립과 계획원리에 관한 연구"----
평지에 성곽을 짓는 경향은 읍성 뿐만이 아닙니다. 지방관의 치소가 위치한 읍성이 아니라 군사적 목적의 관방(關防)용 성곽들인 영성(營城)과 진성(鎭城), 보(堡) 역시 읍치 이외에 주민이 많이 살고 있으면서 방어시설이나 병력 주둔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되고 상당수는 평지에 설치됩니다. 울산병영성이나 강진병영성같은 성곽도 평지거나 평지에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산성이 평지성보다 방어에 유리하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지에 성곽을 지어야할 필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했습니다.
왜 산성의 메리트가 감소하게 되었을까?
견벽청야(堅壁淸野)는 고대 한반도의 전쟁양상을 상징하는 전술 중 하나입니다. 견벽청야와 산성은 한반도의 고대 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한반도 내의 전쟁이나, 외세의 침공은 수도 없이 많은 산성들을 제압하는 고된 경험을 강요당했죠. 함부로 이를 무시하고 수도로 돌파해 들어왔다가는 큰코 다쳐야 했습니다. 수나라는 고구려를 침공하다가 멸망의 길을 걸었고, 당나라는 고구려와 백제, 신라를 상대로 장기간의 끊이지 않는 농성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고려에 침공한 요나라도 비슷한 문제에 시달려야 했죠.
그런데 고려에 대한 몽골의 침공 이후에 고려 후기나 조선시대로 가면 이런 면모가 점차 사라집니다. 단순히 상무정신이 없어졌다거나, 무를 천대해서, 군역제도의 붕괴등 여러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신라 촌락문서로 추정하는 청주 근방의 사해점촌과 모촌의 위치, http://www.koreanhistory.org/1808 참조-----
위의 지도는 이인철의 "신라촌락사회사연구"의 각 촌락 추정위치를 참조해서 한국 생태사 연구자 김동진이 작성한 지도를 활용한 것입니다. 이름을 정확히 몰라 모촌(某村)이라 불리는 촌락의 추정 위치는 산자락 끝에 위치하고, 사해점촌의 추정위치는 현재의 세종특별시 전의면(全義面)일대의 산자락에 둘러싸인 지역입니다.
현재의 충북 청주시 일대인 서원경 지방 4개 마을에 대한 정보인 일명 "신라촌락문서"에서 각 마을의 영역에서 경작지는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촌락들은 대체로 산자락에 붙거나, 둘러쌓여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경작지는 협소하며, 각 촌락 사이는 삼림과 습지로 멀리 떨어져 고립되어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후삼국시대까지 지역 호족은 구릉지나 산에 거점을 구축하고 산자락 밑에 펼쳐진 농경지를 개간했을 것입니다. 계곡의 개천물을 소규모로 쉽게 제언(堤堰)를 쌓아서 농경수로 활용할 수 있는 산자락이 더 선호되기 때문이었겠죠.
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천에 제방을 쌓아서 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한 평야지대, 정확히는 하천 유역의 충적평야 개발은 고려 후기-조선 전기에나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죠.

-----큰 강보다 계곡물이 소규모 저수지를 만들기 쉬웠다.-----
때문에 과거 한반도의 지방 호족들의 거점은 대체로 산이나 구릉지에 설치되고 이 거점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자위공동체가 구성됩니다. 이러한 거점들은 지방세력이 중앙정권의 영향력 하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치소성(治所城)으로 흡수되기도 합니다.
고려 후기 이전까지 이러한 치소나 촌락 사이에는 개발되지 않은 숲과 습지가 널리 존재했을 것입니다.

---시화호 갈대습지 공원, 범람원이 넓게 펼쳐져 습지와 갈대가 널리 펼쳐져 있으면 보급은 끔찍한 작업이었을 것이다.-----
당태종이 발착수(渤錯水)에 이르렀을 때, 진창(淖)에 막혀서 80리가 이어진 수레와 기병이 다니지 못하였다. 장손무기(長孫无忌)와 양사도(楊師道)가 1만여명을 이끌고 나무를 베어 길을 쌓으며, 수레를 연결해 다리(梁)를 놓으니, 당태종이 말위에 나무를 지고 날라서 역사를 도왔다.
신당서(新唐書) 동이열전 고구려
고대 한반도나 만주에서 견벽청야가 매우 유효한 전략이었고, 산성이 주된 방어 거점일 수 있었던 것은 인구밀도가 낮고, 거주지역이 주로 산자락이나 계곡 근방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산성으로 백성의 입보(入堡)가 용이하며, 거주지역과 거주지역 사이가 미개발된 습지와 숲으로 원활한 교통이나 보급이 어려웠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산이나 구릉지에 위치하던 기존의 치소성들은 삼국시대부터 고려 후기까지 인구밀도가 증가하고, 생활거점이 산자락이나 구릉지에서 평지로 확장되면서, 치소의 위치가 평지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수리시설의 규모나 기술수준이 올라가고 노동력 규모도 증가하면서 들판의 관개나 하천유역의 습지개간도 가능해지게 된 덕택이겠죠.
이러한 변화는 단기간에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학계에서는 고려후기-조선전기에 집중적으로 치소의 위치가 산성에서 평지로 이동했다고 추정하였으나, 통일신라 시기의 주요 치소를 비롯해서, 고려시대의 대읍(大邑)들, 예를 들어 청주(淸州), 공주(公州) 등의 충청도 대읍이나 경기도의 광주(廣州)와 수원(水原), 강원도의 강릉(江陵), 원주(原州)의 경우의 치소도 조선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정요근의 "고려 시대 전통 대읍 읍치 공간의 실증적 검토와 산성읍치설 비판"에서 제시하기도 합니다.
정요근은 산성 내에서 고려시대 유물보다 통일신라 때의 유물이 많이 출토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미 고려시대에 산성의 이용도가 감소하였고, 치소보다는 치소의 배후 성곽으로 사용되는게 일반적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충주읍치와 충주산성, 대림산성간 직선거리는 약 4km-----
그는 이러한 대읍들의 배후에 존재하는 산성들이 대읍의 치소 위치에서 짧게는 몇시간 길게는 반나절 이상 걸려야 도달하는 위치에 있어 치소로 두기에 부적합함을 지적합니다. 공주 공산성이나 청주 우암산성은 1km에 불과하지만, 영원산성은 치소와의 거리가 1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이미 주요 대규모 군현의 인구중심지와 산성의 거리가 이격되어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시점이 고려 후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고대 한반도의 인구중심지가 점차 산자락에서 평지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사시 백성과 물자가 빠르게 입보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산성과 백성의 거주지역이 이격되면서 산성의 유지관리도 점차 어려워지고,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산성, 예를 들어 충주 남산성 같은 경우 고려시대 유물이 적어져 점차 사용되지 않게 되었음을 알 수 있지요.
결과적으로 조선 전기에 읍성이 대량으로 축성되기 이전인 고려시대에 이미 치소는 기존의 전통적인 산성에서 평지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치소가 근본적으로 거주민을 통치하기 위한 것이고, 거주지가 평지로 이동할 수록 따라서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려 후기 추화산성에 위치한 치소의 밀양읍성 위치로의 이동----
이러한 치소위치의 변경은 정치적 요인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김광철의 "고려후기 밀양 지역사회의 변동과 치소이동" 에 따르면 밀양의 추화산성에 위치하던 치소가 평지의 취락 인근으로 이동하는 것은 고려시대 중앙집권화에 따른 지역사회의 순응 결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성곽이 없는 평지로 치소가 이동하게 되면서 지방세력이 중앙조정에 저항하기 어렵게 하려는 의도였을까요?
이는 전통적인 한반도의 지역자위공동체가 해체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고려 후기 이전부터 전통적인 지방호족은 사족과 향리로 점차 분화되어 사족들은 중앙으로 진출하고, 향리들의 영향력은 점점 약화되죠. 중앙집권이 강화되면서 전통적인 지역 자위공동체들은 사라져갑니다. 치소의 위치가 방어에 적합한 거점이 아닌 평지로 이동하는 것은 재지세력이 중앙정부의 권력에 복종해나가는 과정이기도 했을 겁니다.
자신에게 예속된 거주민과 토지, 자산을 지키기 위해 휘하의 예속민들을 무장시켜 요새화된 거점을 기반으로 침략자와 알아서 싸워줄 지방세력들은 몽골항쟁기 이후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는 셈입니다. 함흥 기반의 이성계 같은 무력을 가진 지방유력자들은 고려의 영역 밖에서나 존재하게 되지요.
인구밀도가 증가해 주거환경이 평지로 이동하고 지역 자위공동체가 해체되면서, 거주민의 외세와 약탈자에 대한 방어는 국가의 책임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중앙정권이 유효한 군사적 역량이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사회, 생태, 정치적 변화가 이루어지던 여말선초의 시기에 왜구가 날뛰게 되죠.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와 달리 여말선초 시기에 지역의 자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이와 같은 환경과 사회경제의 변화에 기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선 전기 읍성의 축조는 이러한 여건 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의 읍성론 vs 산성론의 결말
조선 건국 초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읍성이냐 산성이냐의 논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산성이 방어적 이점을 가진 것은 과거 역사의 기록에서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실제 전쟁경험을 통해서도 드러나니까요. 임진왜란에서 활약한 명재상 유성룡은 대표적으로 산성의 활용을 강하게 주장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구밀도가 증가하고 생태환경에서 습지는 적극적인 하천유역 개간으로, 삼림은 개간과 화전으로 파괴됩니다.
인구의 중심지가 산자락에서 평지로 이동하면서 조선시대에도 시도된 산성으로의 입보(入堡)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조선 조정은 산성이 군사적으로 방어에 더 유리하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었지만, 거주환경의 변화는 산성으로의 입보전략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조선총독부 유리건판의 경상도 함안의 산성리 산성의 헐벗은 산, 인구밀도가 증가할수록 침략자를 괴롭히는 숲과 습지는 사라진다.-----
게다가 고려후기에 가속화된 생태환경 변화는 산성에 파고들어 지키는 견벽청야 전략의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빽빽한 숲과 갈대가 가득한 습지는 개간되어 농경지가 되고, 울창하던 산림은 거주지역에 가까울수록 화전(火田)의 결과로 사라집니다. 침략자의 보급로 유지를 어렵게 만들던 자연의 장애물들은 조선시대 후기로 갈수록 인구증가의 결과로 소멸되었습니다.
또한 인구밀도의 증가도 자연장애물의 감소와 유사하게 견벽청야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침략자는 적어도 단기간에는 보급로의 유지를 걱정하지 않고 과감하게 요새를 우회하여 전진할 수 있습니다. 병력을 나누어 빠르게 기동하는 이들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약탈이나 징발, 구매를 통해 보급을 유지하기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한반도나 만주지역의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밀도는 침략자가 행군로를 따라 보급거점을 확보해 보급로를 유지해야만 하는 불편함을 강요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동속도를 느리게 하고, 작전기간이 늘어지게 만들었겠지요.

----나폴레옹의 모스크바에서의 철수, 인구밀도가 높은 서유럽이었다면 보급의 부담이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나폴레옹이나 수보로프가 인구밀도가 높은 서유럽에서 17-18세기의 명장들에 비해 과감하게 기동해 요새를 우회해 적의 야전군을 노리는 것이나, 반대로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한 후 블뤼허와 웰링턴의 연합군이 난공불락으로 소문났던 프랑스의 요새들을 상당수 우회해 버린 것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인구밀도가 낮고, 황무지로 보급로 유지가 까다로운 스페인 전역에서는 같은 시기 공성전의 중요성이 훨씬 높았죠.
산성에 입보하여 지켜낸다고 할지라도, 농경지나 거주지역과 이격된 경우에 효과적으로 수비에 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주민의 입보를 유도하기도 어렵고, 주요 거주지나 도로와 이격되어있는 산성은 방어전략상 유효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집니다.
대개 산성(山城) 근처에 사는 백성들은 가재(家財)를 운반하기가 쉬워 일이 급하면 성으로 들어가기가 쉽고 적의 형세가 조금 늦추어지면 하산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수십리 사이는 편리하게 행할 수가 있으나 먼 곳에 거처하는 백성들의 경우는 모두 며칠 일정(日程)의 밖에서 들어오게 해야 하므로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집에 있는 곡식을 멀리 운반하기가 어려운 것은 물론, 그들은 고향을 떠나고 전토(田土)를 버리고서 오므로 가지고 오는 양식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한두 달 동안 적을 기다렸다가 오지 않더라도 산꼭대기 높고 험한 곳에 앉아서 농사를 짓고자 해도 농토가 없고 농사 지을 소와 기구도 모두 흩어져버려 수백리 들에 사는 사람이 없게 된다면, 적이 오기를 기다릴 것 없이 백성들의 살길이 끊어지고 맙니다.
선조실록 30년 1월 9일, 1597년
이런 양상은 임진왜란 당시에도 관측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수백년전인 대몽항쟁기에서도 이미 유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광복산성(廣福山城)에 피난한 향리와 백성들이 방호별감(防護別監) 유방재(柳邦才)를 죽이고 몽고군에게 항복하였다.
고려사, 1258년 9월 12일
달포성(達甫城) 사람들이 방호별감(防護別監) 정기(鄭琪) 등을 잡아서 몽고에 투항하였다.
고려사, 1258년 12월 23일
백돈명(白敦明)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동주산성(東州山城)의 방호별감(防護別監)으로 있었다. 민(民)을 몰아 입보(入保)시키고 출입을 금지하자, 그 주리(州吏)가 여쭈어 말하기를, “벼를 아직 거두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적병들이 이르기 전에 번갈아 나가 베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백돈명은 듣지 않고 드디어 그를 베어버리니, 인심이 분노하고 원망하며 모두 그를 죽이고자 하였다.
고려사 열전, 백돈명(白敦明)
고려조정은 몽골군의 공성능력을 감당하지 못해 해발고도가 높고 깊은 험산(險山)에 대규모 입보용 산성을 쌓고 백성들을 입보시켰으나, 전쟁이 장기화되자 굶주린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 고려 조정이 파견한 산성방호별감(山城防護別監)을 죽이고 투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한반도에서 거주지와 농경지에서 멀고 험한 산성이 당시의 거주환경과 인구밀도를 고려할 때 적합한 피난처가 되기 어려워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산성의 땅은 통상 산이 높고 험준한 곳에 있어 위험하게 경사진 곳이 많아 일반 백성이 그 속에 들어가 살 수 없게 되어 있다. 만약 산성으로서 읍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읍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이라면 평지에 성곽을 쌓아 그곳에 읍치를 설치하여 방어하는 것이 낫다.
유형원, 반계수록 22권 병제후록(兵制後錄) 城池
우리 나라 사람들은 걸핏하면 산성을 말하지만 지난 번에 요동의 금주성(金州城, 명나라의 錦州를 오해한 것 같다.)은 곧 평지인데 3년 동안 포위 당한 채 서로 싸웠으나 끝끝내 함락되지 않았다. 만약 외딴[孤絶] 산성으로 별안간 들어갔다면 몇 달이 넘지 못하여, 양식은 떨어지고 사람은 흩어져 지키지 못하였을 것이다. 감히 해를 어떻게 버티어 넘기겠는가?
유형원, 반계수록 22권 병제후록(兵制後錄) 城池
조선 조정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산성의 방어력에 주목하여, 남한산성의 개축 이후, 광주부의 읍치를 산성으로 이전하고 주민들을 거주시키는 등 산성 내에 읍치를 설치하는 시도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극히 드물게 성공했으며, 대체로 유지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상도 칠곡의 가산산성(架山山城)은 1640년 축성되어 칠곡도호부의 읍치가 되었으나, 교통이 불편하고 세곡을 수납하기에 민폐가 많다는 보고로, 결국 치소는 평지로 옮겨가게 됩니다.
영조 시기에 이르면 최종적으로 조선의 방어전략은 읍성 중심의 방어전략으로 전환되고, 도성 방어 역시 남한산성으로 피신하는 것이 아니라 도성을 사수한다는 "수성윤음"(守城綸音)이 내려집니다. 계속되는 인구증가와 농경지 확대로 인한 거주환경의 변화는 한반도의 전통적인 산성 중심의 견벽청야 전략이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한민족의 전통적인 방어거점인 산성이, 평지의 읍성으로 대체되어가는 과정은 14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생태환경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발맞추어 이루어졌고, 산성의 우세한 방어력이라는 전술적 이점은, 이러한 거시적인 변화가 가져온 전략적 여건을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조선의 축성기술에 주목하여 평가하려 한다면, 읍성에 주목해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거시적인 변화양상을 제외하고 본다고 해도, 순수하게 축성기술이란 면에서 조선시대 신축되거나 개축된 산성과 읍성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산성은 다만 지형적 이점을 제공할 뿐 더 우수한 축성기술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읍성도 가능한 구릉지나 산세를 활용하고자 했지만, 산성에 비해 지형의 이점을 누리기 어려웠기 때문에 오히려 산성보다 축성기술 자체에 더 강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 성곽의 핵심 방어시설인 적대(敵臺), 치(雉), 포루(砲樓)는 평지에 설치된 읍성이 산성보다 설치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방어에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조선의 축성기술이 어떤 강점과 약점이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동시대 다른 국가와 비교해 어땠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평지에 설치된 읍성이 가장 적합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조선 읍성은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참고자료
김헌규 "조선시대의 지방도시 읍치의 성립과 계획원리에 관한 연구"
김헌규 "남한산성의 도시사적 의미"
김동수 "조선초기 군현치소의 이설"
김광철 "고려후기 밀양 지역사회의 변동과 치소이동"
라경준 "조선후기 성곽 축조 기법의 변화"
구열회, "숙종~영조시기 삼남등의 방어체제 정비와 변화"
심정보, "읍성축조에 있어서 ‘築城新圖’의 반포 목적과 고고학적 검토"
정요근, "고려 시대 전통 대읍 읍치 공간의 실증적 검토와 산성읍치설 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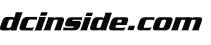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